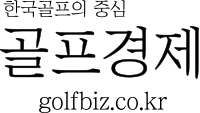뚜벅뚜벅 걷는 것이 좋아 틈나는 대로 밖으로 나가던 일이 이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걷기 위해 대문을 나섭니다.
어느 해부 턴가 가 우리나라는 걷기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나라에서 신경을 무척 쓰는 것 같습니다. 체력이 국력이라는 슬로건이 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 걷기가 쉽지 않은데 제일은 피곤해서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파김치가 되는데 다시 걷는 일이란 건강에 아무리 좋다 한들 쉽게 내키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 놓고 스포츠센터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다 격한 운동을 할 수가 없어, 그래도 걸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매일 걷기를 합니다. 수영으로 전신 운동에 좋아 오랫동안 했으나 이제는 수영장에도 다니지 못하니 걷는 일만이 제게는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운동을 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걷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 나가 마음먹고 길을 걷노라면 각종 교통수단이 다양한 지금은 전동 휠을 타고 유유히 빠져나가고 킥보드를 타고 쌩하니 달려 나갑니다. 아찔한 순간이기도 하지요.
도로마다 자전거 도로가 함께 있다면 덜 불편하지만 공존해 있는 길을 주말 같은 때에 걷노라면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휙휙 지나갑니다. 뒤에서 오는 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달라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서 벨을 울리거나 소리치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데 어느 때는 "지나 갈게요"를 귓가에 울려 주는 매너를 보여 주는 분들이 있어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걷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방해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길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근처 하천가에는 지자체에서 걷는 길과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아 조용히 걸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도시생활을 하면서 혜택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쩐지 인공적인 길이라서 환영할 수만은 없는 길이지만 어쩔 수 없이 걷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길이 아니면 보도블록을 깔아 놓거나 아스타일이 펼쳐진 매끄러운 길을 걸어야 하는데 평탄한 길이어서 크게 운동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매일 2시간가량 걸었습니다. 근력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며칠 전 무릎에 주사를 놓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많이 걷느냐 물으시고 많이 걷는 편이라고 하니
"얼마나 걸으세요?"
"10000보 이상 걸어요"
"무리해서 걷지 말고 조절하세요"
저의 아픈 발과 무릎을 위해서라도 인공적인 도로가 아닌 길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발을 다치고 난 뒤에는 좋은 길을 걷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매일 같이 산에 오르는 친구는 산길을 걸어야지 그런 길을 걸으면 안 된다며 산에 가기를 권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형편에 험하고 높은 산은 갈 수 없으니 뒷동산에라도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보도블록이나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길을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걸을 때 발에 무리가 오지 않는 길은 흙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흙길은 탄력이 있어서 발에 충격을 덜 줄 것 같아서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작은 공원들이 많습니다. 마음은 옛날 어렸을 적에 걸었던 흙길을 걷고 싶은데 공원에도 흙길은 없습니다. 말끔하게 아스팔트나 우레탄으로 덮은 길이 나옵니다.
쌈지 공원 끄트머리에 평소에 사유지 느낌이 들어 가보지 않았던 농막, 비닐하우스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농막 사이로 반들반들 윤이 나는 흙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길은 산으로 연결될 것만 같아 보여 살며시 발을 내디뎌 보면서 농막 주변을 살핍니다. 지나가도 되는 길인지 알 수 없으니 말이죠. 인기척이 없었으며 제지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아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낮은 야산으로 이어지는 길은 한 두 사람이 시야에 들어와 안심이 되었습니다. 활엽수와 침엽수 잎이 이불처럼 덮인 좁다란 길이 숲 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라서 충분히 걸어 올라갈 수 있어 마음은 신이 납니다. 발에도 그다지 무리가 올 것 같지 않아 더욱 좋습니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가볍게 산보가 될만한 숲 속이라 더욱 마음에 듭니다.
아! 다행이다. 이제 흙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구나.
겨울산은 텅 빈 듯이 적막합니다. 잎사귀 다 털어내고 빈 가지만 남아 새 봄에 틔울 잎을 생각하며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지 고요합니다. 수북이 쌓인 낙엽이 푹신하기도 하고 눅눅한 낙엽 냄새가 정겹게 다가오며 푸근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푹 쌓인 낙엽만 보면 교과서에서 읽었던 이양하 님의 '낙엽을 태우면서'가 생각납니다. 매캐한 낙엽 타는 냄새가 금세 번질듯한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역시 걷는 일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맑은 공기와 가끔씩 하늘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상상도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이미 따스한 햇살이 골고루 비추는 산속은 지저귀는 새소리와 드문드문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를 깨트립니다. 금세 꼭대기에 다다릅니다. 후드득 한줄기 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스크로 인해 축축하던 얼굴이 시원하게 청량해집니다. 말없이 서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이 산은 상수리나무가 가장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소나무는 드문드문 보이고 대부분 참나무 종류의 나무들과 오동나무가 몇 그루 보입니다. 오동나무 잎이 군데군데 잔설처럼 하얗게 보입니다. 구불구불 산길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다 보니 운동이 되었는지 어느새 이마에 땀방울이 맺힙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핸드폰을 꺼내서 봅니다. 걷기를 줄이기로 했으니 돌아서 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아직은 새잎이 돋아 나지 않은 산의 정경, 빈 가지로 잔뜩 서 있는 나무들로 적막과 고요가 감돌기도 하지만 조금 삭막한 느낌이 드는 것은 웬일일까요?
산길을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새 몸은 한옆으로 비켜서서 먼 곳을 보며 외면합니다. 상대방도 가까이 스치기를 원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예전엔 산에서 사람을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외치며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미 깊숙이 정답게 건네던 인사말조차 사라지게 했습니다. 쓸쓸함이 감도는 산책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닌 1년이 넘은 일입니다. 어울려 걷는 일은 가족이 아니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혼자 걷지만 하천 둘레길도 여러 명이 대화를 나누며 걷는 장면은 보기 드뭅니다. 사회 곳곳에서 일상적인 너무도 일상적인 일들이 더욱 나 홀로 외톨이가 되어 가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나무들은 오가는 사람들을 묵묵히 바라보며 곧 맞이할 싱그런 봄을 꿈꾸고 있을 텐데, 우리는 언제쯤 밝은 세상으로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을는지요?
이제 흙길도 찾았으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산길을 걸어야겠습니다.
걷기에 대한 명사들의 명언을 떠 올리며 행복한 걷기를 해야겠습니다. 다시 사람들과 맘 편하게 어울려질 세상을 꿈꾸며 말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F. 니체-
"하루를 축복 속에서 보내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 걸어라."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걷는 것이 바로 최고의 약이다." -히포크라테스-
"인간은 걸을 수 있을 만큼만 존재한다." -장 폴 샤르트르-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낫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걷는 곳이 좋다." -허준-
글/안신영 작가, 시인, 1994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 전 수필문학 기자
저작권자 © 골프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