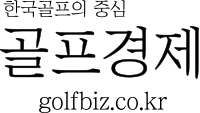"바다 쪽으로 고 싶어요?
산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디라도 괜찮다 하시겠죠?"
그리운 이들 따라 마음은 이미 파도소리 들려와요.
부산이면 바다죠~
그리움이 속속들이 물결쳐요.
푸른 바다를 보면 속이 시원해져요.
하얀 포말을 일으키는 파도 따라 마음도 밀려왔다 밀려가요.
맛집 폭풍 검색해서
맛있는 곳, 풍광이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바다가 통째로 보이는 곳에
나를 앉히고 좋은 시간 째깍째깍 흘러요.
오늘따라 맑고 푸른 바다
"서울 손님 왔다고 그렇잖아 ~"
겨울의 바다는 환영의 파도
하얗게 부서지며 천둥소리 들려줘요.
겨울 바다는 가슴을 뻥 뚫어주네요.
다난한 생각에 감성이 메말라 갈 즈음
"신영 씨, 이 달 모임에 와요~"
하율이의 할머니 그림에 울컥 보러 갈까? 말까? 하던 중
글 모임에서도 부르니 훌쩍 고속버스에 몸을 싣는다.
차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따스함에 몸을 맡겨 까무룩이
잠이 들었다 놓였다 반복하니 어느새 금강휴게소.
잠시 쉬었다 버스는 남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브런치에 올라오는 새 글들을 읽으며 피곤한 눈을 감았다 떴다
어느새 마창대교 아래 푸른 바다가 맞는다.
진해의 부드러운 해안은 어느새 물 빠진 갯벌 위로 갈매기와 사람들이 함께 조개를 캔다고 어울려 논다.
남해의 꾸불꾸불한 바닷길이 벌써 낯이 익어 반가움이 앞선다. 작년 봄 진해의 안민고개 위에서 바라보았던 진해 앞바다가 펼쳐진 것이다.
바다와 함께 그리운 하율이 모습이 가슴속으로 가득 차오른다.
부산을 경유해서 용원으로 내려가지 않고 마산, 진해를 경유해 용원 안골포로 가는 길은 새로운 풍경으로 인해 여행의 맛이 색다르다.
시간을 보니 이제 30여분 달리면 하율이네와 가까워진다.
딸은 걸어오지 말라며 택시를 보낼 테니 몇 시에 도착하냐고 전화로 채근을 하지만 도착 시간을 말하지 않는다. 택시가 있으면 타겠지만 되도록 걸어갈 생각이라서...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경남 용원까지 5시간여를 달려갔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 그 먼 길을 걸어 다닐 수 없으니 자동차, 버스, 기차를 이용해 이어지는 것, 길이란 것에 늘 놀란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어주는 길 덕분에 아침에 출발하면 그리운 딸도 손녀도 친구도 만날 수 있는 길이 갑자기 고마워진다. 길은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소통을 이어주는 것 같다.
또 내일은 글벗들을 만나러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며 다시 부산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또 향숙 씨는 자동차로 우리를 싣고 어느 곳으로 가서 탄성을 지르게 할 것인지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만나고 싶은 가족을 만나고 글벗들을 만나며 맛있는 밥도 먹으며 보내는 시간은 늘 새로운 기운을 받으며 마음은 충만해져 온다. 우리에게 눈과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 향숙 씨는 폭풍 검색을 하였을 것이고, 늘 기대 이상의 맛과 멋을 선사하기에 고마워하면서 탄복하기 바쁘다. 이번에도 탱글 거리는 낙지볶음과 불고기를 청국장에 비벼 먹으며, 감자 치즈 전의 새로운 맛에 놀랐다.
커피가 맛있을 카페를 골라 들어 가 앉아 눈짓으로 언니를 가리킨다. 언니는 수필로 등단했는데도 꿈은 시詩를 쓰고 싶어 몇 년째 시詩를 지어 오신다. 내가 서울에 있는 동안에도 매월 시詩를 지어 합평을 하는 꾸준함이 언니의 시詩는 날로 날로 좋아져 오늘의 시詩는 가슴이 쿵! 내려앉은 느낌이어서 이 글을 쓰면서 언니의 시詩 제목과 우리의 일들이 일맥상통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언니, 어서 숙제 내놔요." 향숙 씨의 말에 언니는 수줍게 내어 놓으며 잘못 썼다고 하면 어쩌지? 선생님께 숙제를 내면서 야단맞을까 겁을 내는 어린아이처럼 느릿느릿 한 장씩 우리 앞에 내어 놓는다. 언니의 시詩를 읽으며 나만 늘지 않는 글쓰기의 실력을 탓해본다.
코코아가 뿌려진 흑당 라테의 달콤한 커피를 한 모금씩 맛도 보고 개운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곧 있을 나의 이사를 축하해주는 순서가 왔다. 독립 축하와 너무 잘됐다며 이사할 집에 없는 전자레인지 들여놓으라며 금일봉도 선물한다.
멀리서 모임에 참석한다고 여비도 챙겨주는 이 분들은 또 이렇게 날 염치없게 만든다.
"우리 가서 자고 와도 돼요?"
"그럼요. 충분해요. 서울 한 달씩 살기 하고 가요."
홀로 툭 떨어져 구르는 돌멩이처럼 지내는 것 같은 쓸쓸함도 한순간 씻어지는 느낌이다. 글썽이는 눈물 방울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파도 자락처럼 몰아친다. 늘 그랬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늘 지켜주는 글벗들.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동기간보다도 더 진한 정으로 여태까지 이끌어 온 글벗들. 언제 다 갚을 것인가.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왔음을, 늘 신세를 지고만 있다는 생각을 한다.
씩씩하게 잘 사는 것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경숙 언니의 시詩를 읽으며 우리의 심정이 그러함을, 지나온 시간과 딱 들어맞음을 알기에 언니와 우리 셋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가 언제부터 만났지? 95년도에 만나 함께 한 세월, 혼미를 거듭했던 나로 인해 10여 년 헤어졌다 다시 만나서 허투루 보내기보다는 생산성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를 암송하며 보낸 좋은 시간 위에 하모니카를 불며 동요, 가곡, 가요까지 언니가 준비해온 악보를 익히며 연주한 시간들, 그 시간들이 우리 위에 쌓여 은은하면서도 달빛처럼 빛나는 가교架橋를 이루어 낸 것이다.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들의 길은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만의 길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가교(架橋)로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
*photo by young.
*글/안신영 작가, 시인, 1994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 전 수필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