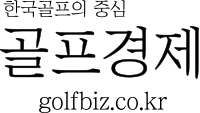전날까지만 해도 포근한 날씨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더니 그날따라 영하의 추위에 바람도 동행해줘 체감 온도는 더욱 내려갔다. 잠실환승센터에서 만난 성남에서 올라온 친구는
"눈까지 살포시 내렸더라, 저번에도 우리 만나는 날 춥더니 오늘도 또 춥네."
환승센터까지 걸어가면서도 모자를 푹 눌러쓰고 친구들을 만난다는 기쁨에서인지 추운 줄도 모르고 20여분 걸어갔다. 꽝꽝 얼어붙은 한강엔 친구 말대로 하얀 눈이 살포시 덮여 있다.
달랑 우리 둘만 태운 대형 광역버스는 1시간 걸린다더니 추워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았는지 논스톱으로 광릉내 종점까지 40여 분 만에 도착했다. 다른 곳에서 오는 친구와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을 하는 바람에 그녀의 집에 갔다가 내가 데리러 나오기로 하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남양주에 사는 그녀는 때때로 친구들이 놀러 와주기를 갈망한다.
몇 해전 여름에도 부산에서 서울 온 김에 한 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사람 좋아하는 그녀는 언제나 밝은 얼굴로 환영해준다. 한쪽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개의치 않고 멀쩡한 우리들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다. 반가운 인사는 그녀의 환한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 우리까지 즐거워진다. 수유리 쪽에서 오는 친구가 도착할 즈음 내가 마중을 가서 데려 왔다.
모처럼 할머니들은 10대 후반의 소녀들이 되어 재잘재잘.
예전부터 수십 까지 발효액 유리 항아리들을 한 방안 가득 진열했던 친구가 차려내 온 밥을 감동으로 먹는다.
조기 어묵볶음, 삼치조림, 멸치볶음, 알타리김치, 심심한 청국장이 우리의 입맛을 살려 줄 때, 안주인은 청국장 끓이는 방법과 조기 어묵 설명하기에 바쁘다. 수유리 친구와 나는 어묵을 좋아하지 않는데 조기로 만든 어묵이라며 먹어 보라고 해서 먹어보니 쫄깃하고 잡내 없이 맛이 깔끔하다. 손님들도 안 남기고 더 달래서 먹고 간단다. 손님들이 잘 먹는 이유를 먹어 보고 알았다.
모두들 주부 9단이지만 귀 기울여 감탄하는 자세가 된다.
"일단, 양파, 파, 다시마로 낸 육수에 청국장 덩어리를 담가 놔.
멸치 육수에 애호박, 버섯, 양파 같은 야채를 끓여, 옆에 담가놨던 청국장이 다 풀어지면 그때 함께 넣어 바글바글 끓이다가 맨 나중에 두부를 넣어 한소끔 끓여 내. 그럼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청국장이 돼."

소박하지만 정성이 깃든 친구의 점심 차림!
소아마비로 인해 그녀는 불편한 몸이지만 언제나 밝은 얼굴로 온 학교를 누비던 종교부장. 그래서 별명이 마당발이다. 지금도 동창들, 선후배 소식은 이 친구의 입을 통해 다 듣는다.
둘째 며느리지만 큰아들 내외가 거부한 시부모를 30년 넘게 모시며 병환 시중까지 들었지만, 돌아가시고 나자 장남이라는 이름으로 시부모와 함께 살았던 집을 내놓으라는 큰아들에게 내어주고 남양주 한적한 곳으로 내려간지도 벌써 10여 년이 된다.
서울에서 하루아침에 시골로 내려 간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 수십 년 삶의 터전이었던 곳을 떠나 온 친구는 마침 조그만 식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심심하지 않도록 식탁과 의자를 갖춰 식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동창회에 나오면 어떻게 꾸려 나갈지를 얘기하곤 했었는데 거창한 식당이 아닌 동네 사랑방 같은 곳으로 말이다. 동네 할머니가 텃밭에서 따온 상추나 애호박을 하나 건네주면 그것으로 반찬을 만들어 밥 한 끼 차려 드시라 하고, 근처 공사장, 공장 등에서 일하는 외국 노동자들이 싼값으로 밥을 먹고 싶어 하면 그들에게 밥도 먹으러 오라고 한다.
욕심 없이 밥을 차려 주는 그녀에게 우리는
"그러다 네 몸만 상하고 손해 나면 어떡하냐?"
"어차피 남편하고 먹는다고 반찬 만드는데 양만 조금 늘려해서 사람들에게 주면 돼."
"그래도 네가 힘들 것 같아." 우리들은 돈도 돈이지만 그녀의 불편한 다리가 걱정인 것이다.
"그 대신 많이 안 해, 주변에 식당도 많고 비싼 밥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 몇 명 안돼. 괜찮아."
그녀의 얘기를 들으니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그녀는 존재하는 것 같다.
하지만 큰 아귀 20마리를 장만하고 어깨가 아파서 고생한 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갈치, 아귀, 삼치, 코다리 등 좋은 생선을 쓰고, 조갯살도 당진에서 공수받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녀의 손해가 막심할 것 같아서 더욱 그랬다.
대형 식자재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다. 우린 더 이상 걱정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녀 스스로 좋아서 가는 길을 우리가 말린다고 변할리 없다. 어쩌지 못한다.

식사를 끝내고 차와 과일을 먹는다. 펠렛 난로에서 구워낸 군고구마도 먹으며 얘기꽃을 피우는데 지나가던 택배 차량이 선다. 들어와 커피 한잔하고 가라고 문을 열어준다.
참새방앗간인 그녀의 식당은 퇴직해서 농사지으러 다니는 교수님도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며 몸을 녹이고 가고(먼저 도착했을 때쯤 바로 다녀 감) 특히 택배 기사들이 오며 가며 들르는 곳이기도 했다. 외출 시에도 문을 잠그지 않고 다니는 그녀는 3년 동안 애지중지 했던 간肝에 좋다는 탱자 담금주를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잃어버렸다. 설탕 대신 꿀을 넣어 담갔는데 꿀이 가장 아깝다고 한다. 그래도 여전히 쉬었다 가라고 식당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볼일을 보러 다닌다고 한다. 작은 마음의 소유자인 나와 다르게 그녀는 참 대인이다.
또 시조카의 전화를 받더니 식구들 데리고 저녁 먹으러 오라고 답을 하는 그녀.
그녀가 피곤할까 봐 돌아가려고 벗어 놓은 코트를 주섬주섬 들추니 더 놀다 가라고 자꾸만 붙잡는다.
"괜찮아, 있는 반찬 차리기만 하면 되는데 더 놀다가 오기도 힘든데." 우린 다시 주저앉는다.
이야기 꽃은 다시 피어난다. 앉아 있다 보면 밤을 새울 것 같아 자주 놀러 오라는 그녀의 말을 뒤로하고 우리는 서둘러 나온다.
지금도 집안 곳곳에 발효액과 담금주 유리 항아리가 놓여 있는 조그만 식당은 그녀의 널찍하고 푸짐한 마음의 공간, 그녀와 우리들 추억이 차곡차곡 쌓이는 공간으로 남을 것이다.
*photo by young
*글/안신영 작가, 시인, 1994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 전 수필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