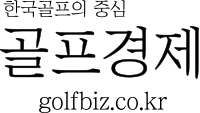예약된 치과 진료를 위해 집을 나선다. 유리창 너머로 늘 보이던 학교 건물이 보이지 않고 온통 하얗다.
온 세상이 뿌옇게 변한 것을 알았다. 순간 당황스러워 두리번거린다.
흰 광목 같은 천으로 휘감은 듯 안개가 속속들이 들어차 휩싸인 것이다.
먼 데서 보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캄캄하다가 몇 발자국씩 발을 떼면 비로소
물체가 드러난다. 이토록 짙은 안개를 만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마치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의 위기감 같은 심정이 되었을 때처럼 그렇다. 내 삶도 안개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느라
조금은 힘들었다.
삶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쉽다면 누군들 고난이라 여기며 힘들어할까.
완벽한(?) 인생설계를 했다 해서 그 길이 평탄한 것도 아니다.
호시탐탐 먹이를 노려 달려드는 맹수처럼 곳곳에 변수라는 함정이 이빨을 드러내고 공격한다.
그대 없인 못살겠다고 매달리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전도유망한 사람이니 성공도 할 것이고, 계획
한 대로 밟아 나가면 원하는 지위에도 오를 것이라 생각하며 함께 삶을 꾸리는 세월이 어떤 변수도
물리쳐내는 용감한 사람일 줄 알았다. 그런데 전혀 아닌 사람이었고 비겁하게 뒤에 숨었다가 제가
편한 대로 가 버렸다.
살다 보니 기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은 것 같다.
가족이니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전부를 걸고 목숨 다해 살았는데 상대방은 그러질 못한 것 같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옛말이 내게는 거의 다 들어맞았다.
뭐든 다 내 맘 같다고 경계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늘 뒤통수 탕탕 얻어맞았다.
안갯속을 걷다 보면 저 멀리는 오리무중인 것처럼 보이나 전진하다 보면 주위는 보일만치 보여 걷
는 데는 큰 불편은 없으나 매일 걷던 길이, 건물들이 낯선 동네에 온 듯 조금은 낯설어 두리번거린
다. 안개에 벗어난 건물이 보일 때 비로소 아, 여기가 거기네? 바로 지하철역이 보인다.
이처럼 가족이 변심했을 때 참으로 낯선 타인이 되더라.
남편도 큰딸도 내게 상처를 준 것에 아직도 완전 치유가 안되었는지 이 길을 걸으면서 삶을 되짚어
보게 된 것이다. 무엇을 잘못해서일까? 그들에게 난 무엇을 성에 차지 못하게 했을까? 시부모 공양
하며 종갓집 대소사를 요즘 말로 내 몸을 갈아 넣듯 열심히 바라지하며 가정을 지켰는데, 어느 날
내동댕이 쳐진 현실에 아득했다.
다 떠나간 과거지사인데 유독 오늘 같은 날 떠오르는 것은 안갯속의 미로 같은 길을 걸으며 희망을
걸어 한발 한발 내디뎠던 나의 길이 한순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풀 한 포기 부여잡을 힘도
내게는 남아 있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살아왔을까? 돌아보게 된다.
그렇게 어찌어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시간 속을 헤매며 때로는
진실되고 맛깔나게, 어느 땐 부실하게 후회와 절망 속에서 허우적 대며 살아온 날들이 공존한다.
이제라도 허투루 살지 않겠다고 늘 생각한다.
안개를 헤쳐나가다 보면 밝은 햇살이 비추어 밝아진 길을 만난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의 삶이지만 남들이 사는 만큼 살아 보려 애쓴 시간들이 녹아 여기까지 왔는
데 좀 우울한 감정은 무엇일까?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 마취와 징징대는 기계음과, 약품 냄새로 혼이
절반쯤은 나간 것 같은 상황에서 더욱 침잠되어 가는 기분으로 헤매는 것 같다.
구름과 달
치아도 그렇지, 미리미리 게으름 떨지 말고 진료를 잘 받아 왔다면 좀 더 건실한 치아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싫다고 미루어 병을 키운 꼴이 된 거지. 또 미리미리 예방에 힘써서 나쁜 상황이 오도
록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거지. 뒤늦게야 깨닫고 정기적인 검진을 빼놓지 않고 하지만 이미 나빠진 상
황에서는 조심하고 유지만 잘해도 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치아 좋은 것이 왜 오복인지 깨닫고, 몸
이 천냥인데 그중에 구백 냥은 왜 눈이라고 했는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구구절절 어른들의 말
씀이 절실히 다가온다.
스쳐 지나듯 가버린 날들을 아쉬워하진 않으리라던 마음이 요즘, 부쩍 그땐 이럴 것을, 저랬으면 괜
찮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젊다고 오만 방자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면서 어느 순간만큼은 부
정하고 싶을 때가 있으니 나도 별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인가 보다.
이렇듯 젊을 때 생각하지 못하고, 가늠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좀 더 겸허해지고 자중하
는 마음도 커지는 것을 느낀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그동안 평온했던 마음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며 아우성치는 소리를 질러대는
것은 웬일일까?
창릉천 밤의 물안개.
*photo by young.
글/안신영 작가, 시인, 1994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 전 수필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