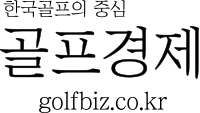이른 아침 잠시 비가 그친
무궁화 공원을 다시 걷는다.
지난 유월엔
몇 송이 피어 있지 않았더니
이젠 지고 있는 무궁화 꽃.

나무를 가득 메워 피어 있고.
또 한 송이만 남아 있기도 하다.
꽃송이 가득 메운 나무보다
한 송이에 더 마음 가는지
모를 일이다.

공원 한쪽 울타리엔 동백나무가 줄 서 있다.
아기 주먹만 한 열매들이 숨어서 엿보는 것 같다.
사잇길을 걷는데
비에 젖은 풀숲에 길냥이 한 마리
"사진 찍어 줄까?"
서서 바라보아도 달아나지 않는다.
빤히 바라보는 너.
너를 위해 먹을 거라도 지녔어야 했을까?
미안하다 미안해...

외로운 길냥이 굶지 않았으면 해.
여기 손님이 아니라면 챙겨주기도 했을지 몰라.
허나 아이야, 난 손님이란다.
너도 어쩌면 손님?
그래 우리 모두는 지구별의 손님이지?

손녀 하율이에게 와서 비 없는 날이 몇 날이었나?
오던 날, 이튿날 소나기가 지나가고
가을장마라며 비바람 몰아치더니
오마이스 태풍이 부산 여기저기를 물 먹였다.

다행히 용원 안골엔 비가와도 괜찮았다.
폭포처럼 물줄기가 바다로 몰려갔다.
바다는 그 많은 빗물을 말없이 다 안아 줬다.
불평 없이 넓은 품의 바다, 그 마음을 닮고 싶다.

*photo by young.
글/안신영 작가, 시인, 1994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 전 수필문학 기자
저작권자 © 골프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