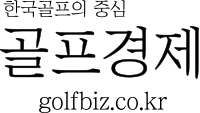어제부터 가려고 계획했던 경남 창원시 웅천 안골왜성(安骨倭城)을 가기 위해 길을 나선다. 터널 위의 언덕길로 올라서며 바람에 흩뿌려지는 보슬비를 마다하지 않는다.
인적이 드문 산길을 가려니 살짝 하늘의 짙은 회색 구름 마냥 불안한 마음이 드리운다. 그렇지만 왜성이 어떤 모양인지 궁금해서 발길을 멈출 수는 없다.
나무계단으로 된 길을 올려다보며 아득한 느낌을 받는다.
어쩌지? 하면서도 아픈 무릎을 살살 달래 가며 한 개 한 개 걸어 올라가다 보니 저 멀리 신항의 모습이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인다. 찰칵찰칵!
늘 느끼는 것이지만 아침 일찍 산에 오르면 새소리가 가장 맑고 높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은 확실하다.
잘 들어보지 못한 새소리와 풍경에 동영상을 촬영해본다.

계단이 끝나는 곳에 다다르니 널찍한 평지가 펼쳐지고 왜성 안내를 하는 나무 안내판이 허수아비처럼 서서 맞아준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본성 쪽으로 가니 엊그제 풀을 깎았는지 걷기에 편하다. 어제 비가 내려 전부 깎지 못하고 한쪽만 깎여 있는 것이 보인다.
본성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보니 바위를 깎아서 성을 쌓은 흔적이 보인다.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이 이곳에 천연의 요새를 구축하기 위해 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설명되어 있다.


안골포는 조선수군의 석성이 있었고, 임진왜란 때에는 왜군이 일본식 성곽을 쌓기도 한 곳이다.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고, 부산 방면의 가덕수로와 통영 방면의 수로를 통제하기 좋으며, 뒤에는 험한 옥망산이 있어 수비하기 좋은 천혜의 요새지이다. 이러한 입지 조건은 조선과 일본 수군 모두가 같은 곳에 축성하게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제포진(진해)에 소속된 안골포 영에 수군만호가 이끄는 조선군이 주둔하였는데 둘레 56m(1714척), 높이 3m(10척)의 성벽과 안에 우물과 시내가 있는 성이 있었다 한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은 안골포 위의 높은 곳을 택하여 일본식 성곽을 쌓았다. 둘레 594m, 높이 3~7m, 면적 63,577제곱미터의 성곽은 1593년 경에 왜장 와키사카 등이 쌓고 주둔하였다. 성곽은 4개소로 나누어 삭평하고 3개소의 내성과 1개소의 외성으로 되어있다. 내성은 모두 돌로 쌓았으며, 왜성의 일부는 흙으로 쌓았다.(삭평: 반란이나 소요를 누르고 평온하게 진정시킴)이 성곽의 축조에는 5만 명가량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터에는 17세기 후반 이후의 조선백자도 출토되고 있어, 왜 군이 쫓겨간 뒤에 안골왜성이 조선수군에 의해 다시 이용되었을 가는성도 제기되고 있다.


2왜성으로 가는 길은 풀밭이어서 조금 겁이 난다. 어릴 적 이런 풀이 쌓여 있는 길을 걸으면 뱀 들이 출몰했기 때문이다. 은근 겁도 난다. 다행히 뱀딸기는 보여도 뱀은 안보여 다행이라 생각한다. 새벽녘에 나와 사람도 보이지 않는 산중에 홀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기 위해 마음으로 다짐한다. 보슬비는 바람에 날리고 바람소리 새소리만이 산중의 정적을 깨트리는 가운데 비 온 뒤에 솟아 나온 버섯이 눈길을 끈다. 2왜성에서 1왜성과 본성 앞으로 나오는데 후투티 한 마리가 날아든다. 감동!



3왜성 쪽은 사람이 다녔던 흔적이 나 있어 걷기가 조금 편하다. 돌을 쪼아 산 위까지 운반하여 석축을 쌓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무거워진다.
3왜성에서는 안골포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3왜성을 돌아보니 산에 길이 나 있어 아까 올라왔던 계단이 아닌 산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숲의 젖은 길을 한참을 걸었지만 더욱 가파른 흙길을 만난다. 아쉽지만 돌아 나오며 다시 계단 쪽으로 걷는다.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오는 데 고목나무가 눈에 띈다. 살며시 나무를 기어오르는 담쟁이와 마삭줄이 귀엽다. 그들은 칡과 달리 공생하며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아이들이다. 나무를 칭칭 감거나 둔덕을 덮어 버리는 칡을 바라보면 갑갑하다.


사람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몰상식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듯이 자연에도 자신이 살기 위해 저렇듯 살아가는 식물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잊고 최소한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나.
어제 만난 글 모임의 시인은 내게 말한다.
"화는 우리가 대신 내줄 테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지금처럼 딸들하고 잘 살아온 것처럼 살아요" 한다.
'부산에 왔으니 바다 봐야지?' 하면서 일광 바닷가, 풍경 좋은 곳으로 데려가 맛난 브런치를 먹게 해 주고, 머리를 식혀주던 시인이 고맙다.
이 아침 나무를 타는 식물들을 바라보니 유난히 떠오른다.

*photo by young.
글/안신영 작가, 시인, 1994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 전 수필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