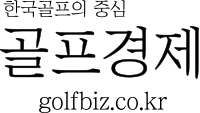경남 창원시에 사는 둘째 딸 손녀 하율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낸 후에 바닷가로 내려갔다. 어느새 물은 들어오는 물이 되어 꽉 차 있다. 어제보다 안개는 옅게 드리워 오늘 낮에도 많이 더울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가 진해바다 70리길 7구간 도착점인 굴강에서 더 멀리 안골 부두까지 갔다 오면 왕복 3km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해본다. 그럼 산책으로는 꽤 괜찮을 거리이다. 여름이어서인지 갈매기도 한 마리만 보이고 물오리나, 물닭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바다는 심심하다.

줄지어 서 있는 굴막도 굴 철이 아니라서 전부 자물쇠로 채워져 있다. 하율이는 지난 금요일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 먹고 싶어요." 했다.
"응? 뭐지?" 의아해 하는 내게 딸이 설명 해준다.
"아, 엄마 조갯살 넣은 파스타. 저번 부터 먹고 싶다고 하네요." 토마토페이스트 스파게티를 만들어 줬더니
"할머니가 만들어 준거 먹고 싶어." 했단다.
굴막이 전부 문을 닫았으니 굴도, 조갯살도 살 수가 없다. 지난 3월에 왔을 때 싱싱한 통영 바지락살을 살 수 있어서 조갯살 파스타를 만들어 줬는데 그 파스타를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다. 5월부터 7월 까지는 굴이 나오지 않으니 굴막은 전부 문을 닫은 것이다. 그러니 알이 굵고 싱싱한 통영 바지락살도 구할 수가 없다. 하율이에게 가을까지 기다려 달라는 수 밖에 없겠다. 물론 마트에 가면 조갯살이 있기야 하겠지만 흡족한 물건이 아니니 다음에 할미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수 밖에 없다.

어제 가려고 했다가 가지 못한 흰돌 메 공원이 있는 산이 바다 건너에 보인다. 새라면 바다를 가로질러 날아갈 수는 있겠지만 두 고개를 넘어 돌아가야 하는 저곳이 손 끝에 잡힐 듯이 보인다.

길가에 참골무꽃과. 뽕나무가 바다 끝자락에서 나고 자라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은 것을 발견한다. 풀과 나무는 조금의 흙과 물만 있어 준다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뿌리를 내린다. 해님은 구름 속에 숨었다가 "까꿍"하며 얼굴을 내밀다가 다시 숨곤 한다. 해님이 얼굴을 내미니 오늘도 역시 매우 더운 날씨다. 굴강까지 걸어 본다. 이곳에 올 때마다 굴강을 보곤 하는데 대체 굴강은 무엇인가? 오늘은 표지판을 한참 들여다보며 설명을 읽는다.

<굴강은 조선시대 선박의 수리, 보수, 군수 물자의 하역 특수 목적 선박 등의 정박을 목적으로 세운 군사시설로 방파제와 선착장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다. 이곳 굴강은 조선 세조 8년(1462년)에 이 고장의 방어 기지로서 안골포 수군 민호진을 설치할 때 축조하였으며, 굴강 상부의 석축이 일부 허물어지기는 하였으나 하부는 매몰되어 온전히 남아 있다. 또한 현재 매립되어 육지로 변해버린 기존 도로에도 굴강이 연결되거나 굴강과 관련된 유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대첩 이후 안골포에 주둔한 왜 수군 함대를 격파하여남해군의 재해권을 완전 장악한 안골포해전으로 유명하다.>

표지판에 적힌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부두 쪽으로 걸어간다.저 멀리 미련이 남아 있는 흰돌 메 공원 쪽을 바라보며 안골포 표지석이 서 있는 곳까지 걸어간다. 그 많던 바다새들은 어디로 갔을까? 바닷물속을 들여다보니 자잘한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코딱지만 한 소라고둥들이 미끄럼 타듯 미끄러지며 돌아다닌다. 새들이 없어 그들에겐 평화로운 시간인지도 모르겠다. 철썩철썩 물이 출렁이며 다가와 방파제에 부딪치는 소리가 그나마 무료함을 달래주는 그때, 왜가리 한 마리가 앉을 곳을 찾아 날아드는 게 왜 그리 반가운지 모르겠다. 굴막은 문을 닫아 굴을 까는 달그락 거리는 소리와 아줌마들의 두런거리는 말소리까지 닫혔다.
사람 사는 정겨움이 밀려오던 세상의 한 자락을 보는 것 같았는데 아쉽다. 이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모양이다. 사람은 한데 어울려 어울렁 더울렁 살아야 하는가 보다.

*photo by young.
글/안신영 작가, 시인, 1994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 전 수필문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