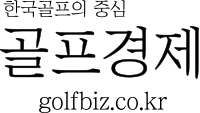가을산
오늘 가을산과 들녘과 물을 보고 왔습니다
산골 깊은 곳 작은 마을 지나고 작은 개울과
들 건널 때 당신 생각 간절했습니다.
산의 품에 들고 싶었어요.
깊숙이 물의 끝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물소리랑 당신이랑 한없이.
- 김훈동의《붉은 유뮈》중에서 -
작가는 가을산과 들녘, 물을 보고 돌아와 절대적인 사랑의 고백을 상대에게 쏟아 놓는다.
시인을 부러워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려나? 마음으로 기웃거려 보며 가을을 걷는다.
길을 걷노라면 붉은 단풍과 노랑으로 물든 은행잎, 형형색색의 나뭇잎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음을 보게 된다.
이곳은 튤립나무와 느티나무가 아주 많은 동네다.
아침에 산책을 하노라면 밤 사이에 나무 밑에 수북이 쌓인 낙엽의 동산을 볼 수 있다.
튤립나무는 백합나무라고도 불리며 잎사귀 모양이 마치 튤립 꽃 모양이다. 노랗게 시작해서 붉게 물들어 가는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바라보다 저절로 '아~ 이쁘다' 하며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온다.
색색으로 물든 나뭇잎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더더욱 선명한 빛깔로 계절을 노래하면, 소녀적 시절로 돌아가기에 충분하다.
거리를 걷다 노란 은행잎 하나 주워 책갈피에 넣어 두고, 빨간 단풍잎 하나 주워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 만들 카드의 재료로 써야지 하는 생각으로 낙엽들을 모으던 소녀시절....
굳이 가을산에 오르지 않아도 그리운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기웃거리고, 소중했던 일들이 떠올라 깊어가는 계절에 더욱 간절한 소망이 하나 씩 늘어 가고 있음을 감출 수는 없다.
한낮에, 먼데 사는 친구의 전화.
"뭐하니? 밖에 단풍이 너무 곱다. 빨갛고, 노랗고..."
"이곳에도 너무 이뻐. 거리에 나가면 온통 눈이 부실 정도야...."
깊어 가는 계절이다.
이웃집 담장의 화살나무는 그 자태가 하나의 꽃나무를 방불케 하듯이 붉게 빛나고, 앞서가던 호야는 밟고 지나가던 낙엽 소리에 제풀에 놀라 뛰어가다 돌아온다. 제 턱밑에 나뭇잎 하나 달고는 더욱 놀라워한다.
이렇듯 가을은 서둘러 떠나가고 우리의 가슴도 세월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가 보다.


어제 내린 비로 아침 기온이 제법 쌀쌀하다.
바람막이 점퍼의 지퍼를 올리며 옷깃을 여민다. 오늘은 서삼릉 누리길의 산 쪽으로 걸어 보려 하나 물기가 있어 여의치 않다. 지난번 가을 숲에서 주운 도토리를 산에 뿌려 주려고 들고 나왔으니 얕은 산이지만 숲 속 동물들의 겨울 양식이 되라고 곳곳에 두고는 바로 큰 길가로 내려간다. 동그랗고, 길쭘 하기도 한 여러 도토리들이 귀여워 줍다 보니 두 주먹이나 되었다. 도토리 열매라며 보여줄 손녀도 옆에 없어 며칠 혼자 보다가 내 욕심에 숲 속의 다람쥐들이 굶겠구나 하는 미안함에 부끄러워 산책을 나서면서 들고 나와 산속에 놓아둔 것이다.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다.
한우물 숲길 공원 저류지로 발길을 옮긴다.
산자락에 노랗게 피어 아롱지는 산국을 보니 벌써 깊어 가는 가을이 역력하다. 여름 숲을 물들이던 초록의 풀들이 엷게 마른 빛깔로 채워지며, 부지런히 마지막 힘을 쏟아 피고 지는 쑥부쟁이들이 조그만 낯으로 반짝이고 있다. 이름에서부터 애처로운 며느리밑씻개는 탱글탱글 보랏빛 열매를 익혀가고 있다. 누가 뭐라든.



밤사이에 떨어진 나뭇잎들이 비로 인해 나무와 서둘러 이별을 고했을 마음이 보여 안타깝다.
그렇게 가을은 쇠락의 계절로 가면서도 한쪽에서는 붉은 열매를 소복소복 꽃송이처럼 달고 있어 풍요를 맛보게도 한다. 계절의 이중성이라고 해야 하나? 한쪽은 떨구어지고 한편에선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으니 말이다.

오리들이 물구나무서기를 하던 저류지를 몇 바퀴 돌면서 주위를 둘러본다. 꾀꼬리도 떠났는지 꾀꼬리 소리 들리지 않고 멀리 목이 트이지 않은 산비둘기 한 마리 탁한 음으로 구구 구구를 울린다.
뛰는 사람,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이야기 꽃을 피우며 열심히 발을 놀려 저류지를 도는 사람들 틈에서 하늘을 보다 나무를 보다 축 늘어진 나무의 열매를 보며 '무슨 나무지?' 지난여름 꽃을 마치 물푸레나무 꽃처럼 포슬포슬 무더기로 피어 올리더니 어느새 열매를 맺었네. 이젠 나무 알아내기 어플을 깔아서 알아내야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또 공원 관리사 곁에 한 무리의 나무들 틈 속에 빨간 열매.
무슨 나무지? 꽃이라면 바로 검색에 들어가는데... 잎은 수국 잎 같은데 조금 작다. 나무줄기는 비슷한데? 수국이 이런 열매가 열렸던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열심히 물음표를 달며 사진을 찍어 본다. 눈은 서둘러 꽃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면서.


걷다가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께 혹시 아시냐고 여쭤 보지만 모른다고 하신다.
한 바퀴를 다시 돌며 다른 쪽 나무 덤불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잔디밭이라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짝살짝 걸음을 옮긴다. 가까이 가니 지다 만 꽃이 보여 바로 검색해보지만 일치하는 게 없어 보인다.
알알이 맺힌 빨간 구슬 같은 열매가 어지나 예쁜지... 결국 나무 알기 어플을 깔아서 가막살 나무라는 것을 알았다. 조금 남은 꽃으로 찾아보려 했으나 엉뚱한 이름만 나와서 찾고 또 찾아보다가 이틀이 지나갔다. "까마귀가 먹는 살"이란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돌아오는 길에 키가 큰 나무에서 눈에 번쩍 뜨일 만큼 빨간 열매가 보인다.
알아보니 요 아이는 미국 낙상홍. 얘는 보통 낙상홍보다 키도 크고 열매도 크다.


이렇듯 아침의 걷는 시간은 걸으며 생각의 깊이를 나누기도 하며 풀꽃과 나무 열매들과의 교감을 이루면서 풍부해지는 마음이 되니 즐겁다. 그들은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땀 흘리며 버텨온 지난 계절을 생각할 것이다.
단단해지며 겨울을 준비하며 자연의 일부가 되는 그들을 바라보며 나 자신도 더욱 단단해지고 깊이 숙성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photo by young.
글/안신영 작가, 시인, 1994년 문화일보 신춘문예 당선, 전 수필문학 기자